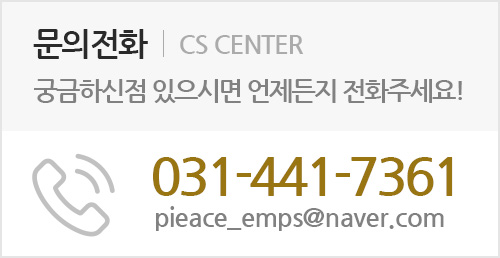[평화칼럼] 책임에 관하여
석영중 엘리사벳(고려대 교수)
Home > 여론사람들 > 평화칼럼
2020.06.07 발행 [1567호]
 |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매일 수백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던 시절, 뉴스에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환자들의 감염 소식을 접할 때면 감정을 자제하기 어려웠다.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은 유독 처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모장에 적어 두고 그냥 ‘이론적으로’ 가끔 되새기던 고(故) 최인호 선생의 말이 갑자기 번개처럼 가슴에 와 박혔다. “우리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덕분입니다.” (‘서울주보’ 2012. 1. 1.)
먹을 것 다 먹고, 웃을 것 다 웃고, 크고 작은 불편 외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내가 편안한 소파에 앉아 TV 화면에 비친 고통의 현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자체가 부조리극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의 고통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다. 에밀 시오랑은 그것을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동정심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투적이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책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일갈한다.
“어떻게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없는 빛을 즐길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누군가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즐길 수 있겠는가? 나는 타인의 암흑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나 자신을 마치 빛을 훔친 도둑인 것처럼 느낀다.”
아무도 그 무엇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린 세상이다. 시간이건 돈이건 자기 것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박애를 외치는 사람, 거대하고 공허한 구호가 세상을 바꾼다고 착각하는 사람, 책상 앞에 앉아 현란한 어휘로 정의를 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명백하게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드문 세상에서 아무 상관 없는 타인의 불행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불가능의 차원을 넘어 초현실적인 궤변처럼 들린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대구 병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이 그들이다. 시간, 체력,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 내걸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끝까지 헌신한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나 자신을 포함한 인간 모두가 결국 적자생존의 덫에 걸린 동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끝없이 좌절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간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고통에 처한 타인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만 인간은 윤리적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응답은 단순한 관심이나 응대보다 훨씬 심오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타인의 존재와 의식을 나와 동등한 존재와 의식으로 인정하고, 타인을 내 존재로 환원시킴 없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적인 정의의 문제도, 윤리적 당위의 문제도 아니다. 따지거나 분석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세상의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한다.
석영중 엘리사벳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슬라브어 문학박사 △고려대 노어노문과 교수ㆍ고려대 도서관장 △前한국러시아문학회장 △前한국슬라브학회장 △「도스토예프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푸슈킨 문학작품집」 ,「톨스토이의 첫걸음」 등 역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