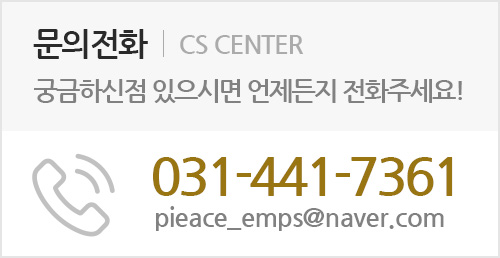세계의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직인 WWF가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인류 문명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거나 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화해 왔다. 그렇다면 인간의 힘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브라이언 페이건(Brian Fagan) 캘리포니아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농경·정착·산업화·자본주의로 특징을 짚어낸 문명사 흐름에서 인류의 기후 통제력은 확대돼왔으나 기후 대재앙을 겪을 취약성도 점차 커졌다고 답한다. 페이건 교수는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두고 문명의 흥망사를 서술한다. 나무의 나이테, 고대 습지·늪지에서 나온 꽃가루, 빙하·호수·바다 밑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는 식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화를 간직한 우르. 바그다드와 페르시아만 돌출부의 중간지대인 이 땅은 현재 열파(熱波)와 신기루가 조롱하는 황폐한 사막이다. 우르는 작은 농업 공동체로 출발했으나 물을 영리하게 확보·관리하고 신(神)의 노여움을 달래가며 세계 최초 문명 중 하나를 꽃피운 도시국가로 발전했다.
기원전 2200년쯤 우르 북쪽에서 화산이 폭발해 그 화산재로 어둠과 추위가 닥쳤고, 그 후 278년 간 지속된 가뭄이 일대를 사막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가뭄 같은 재앙을 이겨낼 생존의 조건으로 ‘규모’에 주목한다. 인구가 3배 이상 폭증하면서 집단이동이나 이웃마을로부터의 곡물 대여 같은 재앙 대처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붕괴한 것이다.
마야 문명의 쇠락도 환경(가뭄)의 공습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본디 가뭄·폭우로 황폐했던 중앙아메리카 땅을 농부들이 화전으로 일구고 농경·관개에 힘써 붕괴 직전인 800년쯤엔 1000만 인구의 과밀 사회를 만들었다. 문제는 또 ‘규모’였다. 자급능력을 넘어 팽창한 도시인구와 비생산적 귀족층의 기생(寄生)이 가뭄에 더해 문명 소진을 재촉했다.
저자는 전 지구적 온난화가 1만2000년 전 시작됐다며 온난화의 장구한 역사를 들춰낸다. 이 시기는 마지막 빙하기가 소멸하고 3만년 전부터 유럽의 주인으로 군림했던 크로마뇽인들이 사라진 무렵이다. 인류는 위대한 발명품인 바늘과 실을 활용해 혹한 지대를 살아갈 수 있었고,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툰드라 초원과 얕은 강을 건너 시베리아까지 삶터를 넓혔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고대 유럽인들의 남·북 이동이 기후지대의 변동에서 비롯됐다고 풀어낸다. 지난 3000년 간 남쪽 대륙성 기후대와 서쪽 지중해성 기후대의 경계가 거리로는 880㎞, 위도로는 12도나 남북으로 오르내렸고, 기후 변화는 고대인들의 이주를 재촉했다.
저자는 현재와 같은 지구 온난화 추세가 1850년부터 유지됐고, 화석연료·오염물질 증가가 주범이라고 해설한다. ‘길고 불안한 지구의 여름’이 인류의 취약성을 말해 주지만, 길게 보면 1만년이 넘게 진행된 변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후와 역사의 대화’라는 저자의 해석 방식이 문명사를 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원제 ‘The Long Summer: How Climate Changed the Civilization’
조선일보/박영석 기자